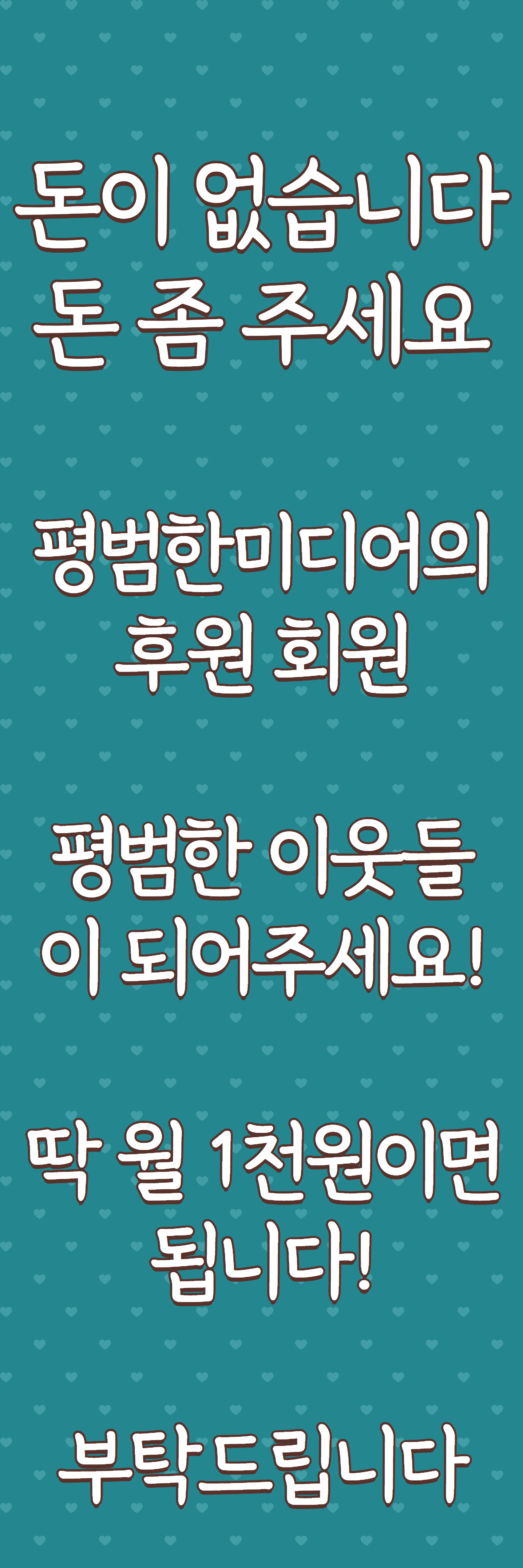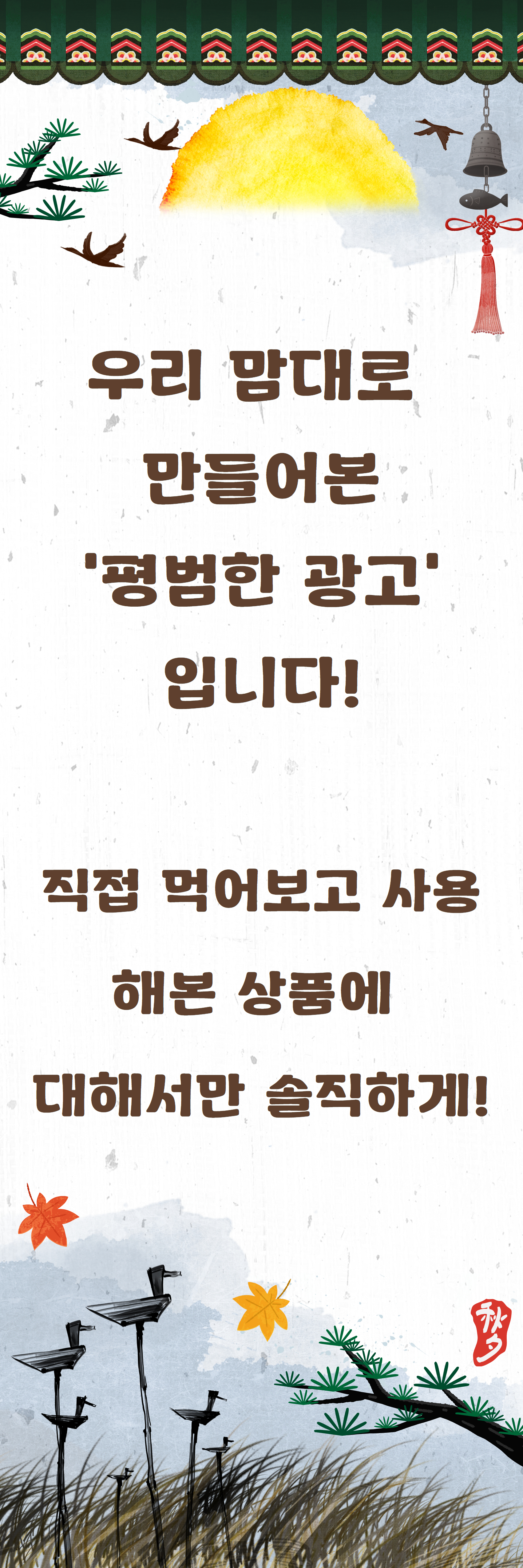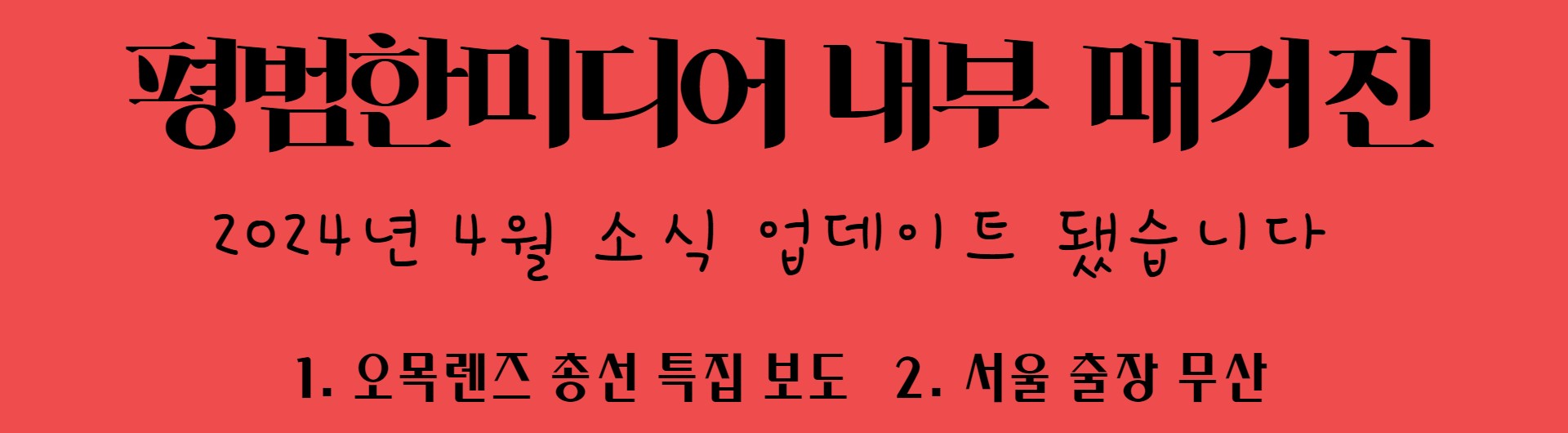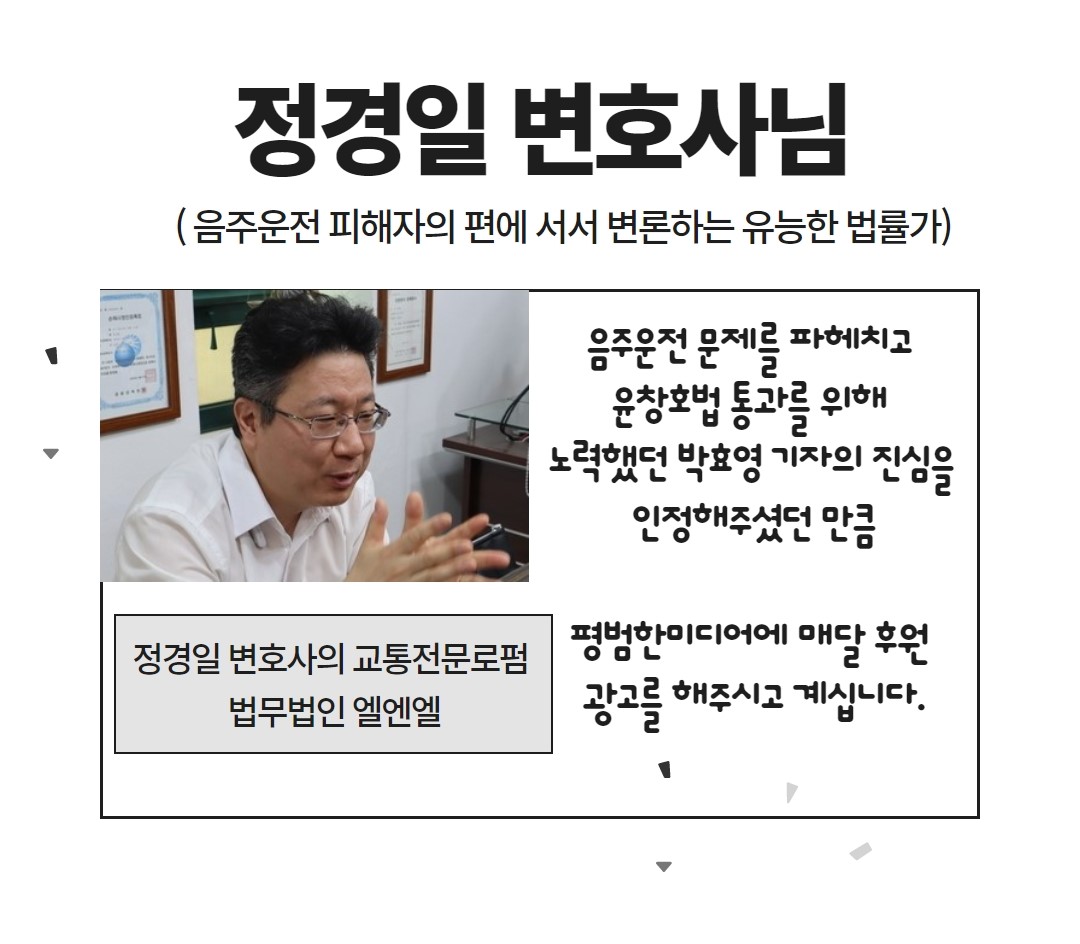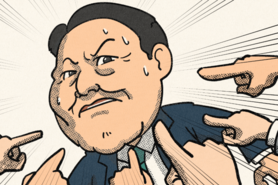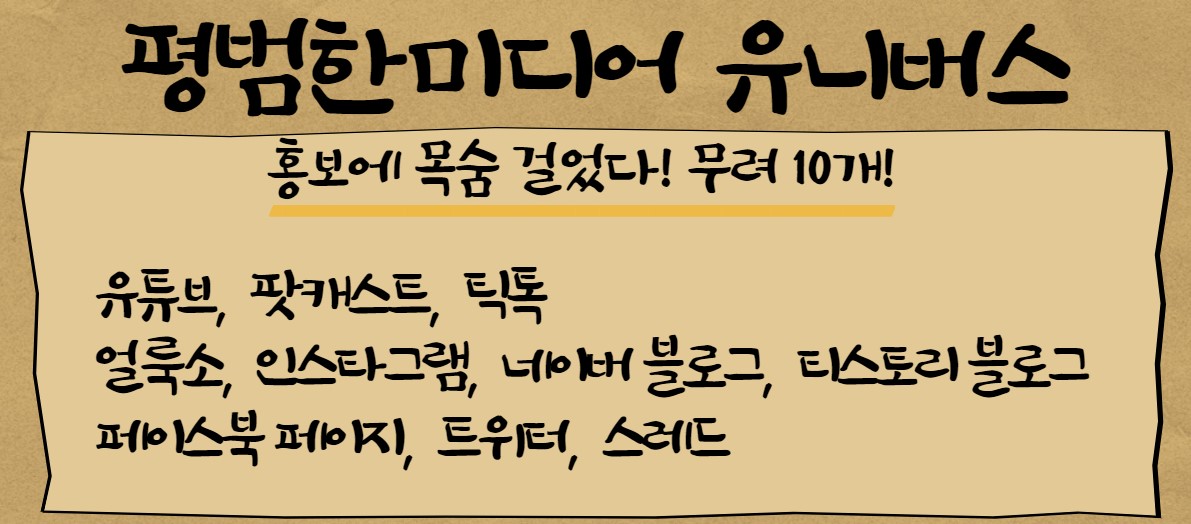#2024년 3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조은비의 비엔나 라이프] 2번째 글입니다. 조은비씨는 작은 주얼리 공방 ‘디라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울증 자조 모임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모든 걸 잠시 멈추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게으르게 쉬는 중”이며 스스로를 “경험주의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평범한미디어 조은비 칼럼니스트] 비엔나는 한 나라의 수도이지만 서울보다 느리게 흘러간다. 두 도시 모두 규정 속도는 시속 50km로 같지만 서울에서 그 속도를 지키다가는 뒷 차량의 짜증스러운 경적을 들을 수밖에 없다. 금방 추월당하기도 한다. 비엔나에서는 모두가 신기하게도 규정 속도를 준수한다. 조금 느리지만 엑셀 페달을 세게 밟지 않는다.
식당에서도 애가 탄다. 얼른 계산하고 다음 일정으로 빨리 넘어가고 싶더라도 직원을 부르거나 재촉할 수 없다. 기다림 끝에 계산을 마치고 분주하게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친구로부터 don't need to be rush. Take your time. 이런 말을 듣기 일쑤다. 비엔나는 내 몸에 자연스럽게 베어 있는 빠른 속도감과 긴장감을 내려놔도 되는 곳이다.

비엔나 시민들은 남에게 관심도 많다. 다들 ‘스몰 토크’ 자격증 하나쯤 보유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 정도로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고 칭찬을 건넨다. 막연하게 서양은 ‘개인주의적’이라고 배웠고, 동양은 ‘정’이 많다고 알고 있었는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었다.비엔나에서는 모르는 사람들끼리 친근하게 인사를 건넨다. 마트 캐셔와, 레스토랑 서버와, 지하철 앞 사람과, 집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과 스스럼없이 안녕이란 말을 주고 받는다. 사실 처음엔 불필요하고 거추장스러운 인사말이라고 생각했다. 왜 이런 무의미한 소통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괜히 추근덕대는 이상한 사람이 아닐까 휙 도망가기도 했다.
도대체 비엔나 시민들의 여유로움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부유해서? 막강한 ‘합스부르크 가문’의 후예라서? 그렇진 않은 것 같고 맑은 공기와 도심 곳곳에 마련된 녹색 공원들에서 어릴 때부터 학업 스트레스 없이 뛰어놀 수 있었던 사회적 배경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
6.25 전쟁 이후 최빈국의 현실을 탈피하기 위해 ‘근면성실’을 미덕으로 앞만 보고 달렸던 내 나라의 역사가 대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절박함과 안간힘이 안쓰럽게 느껴졌다. GDP 경제 규모로만 따지면 대한민국(1조 7000억 달러)은 오스트리아(5200억 달러)보다 부유하다. 그런데 한국의 일상은 여전히 여유와는 거리가 멀다. 지역, 연령, 성별을 막론하고 모두가 너무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달리지 않거나 달릴 수 없으면 뒤쳐진다. 뒤쳐진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멸시가 만연하다.
우울증 발병률 1위, 자살률 1위, 출생률 꼴찌. 평생 불안감 속에 살아가는 한국인들의 슬픈 자화상이다. 자리 앉기도 전에 출발하는 버스 안에서 어떻게 아기를 안고 유아차와 함께 탈 수 있겠는가? 휠체어 장애인이 온갖 눈총을 받으며 만원 지하철에 탑승할 수 있겠는가? 한국 사회에 흐르는 분위기는 속도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가치 없고 관심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만 같다. 그래서 나도 한국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꿈을 점점 내려놓게 되었던 것 같다. 조금 느려도 되는 이곳에서 원래부터 살고 있었다면 완전히 달랐을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