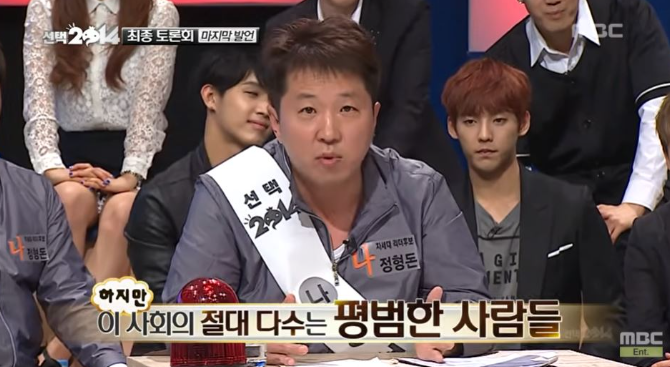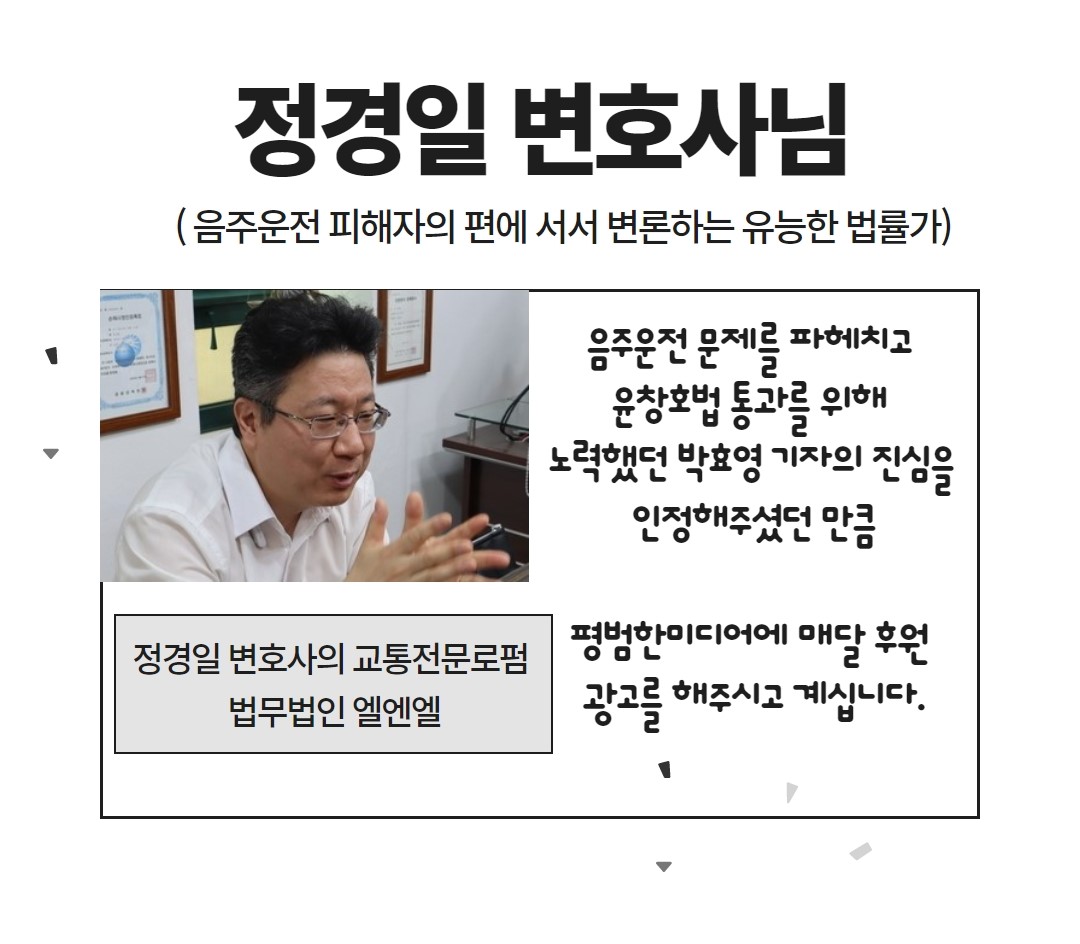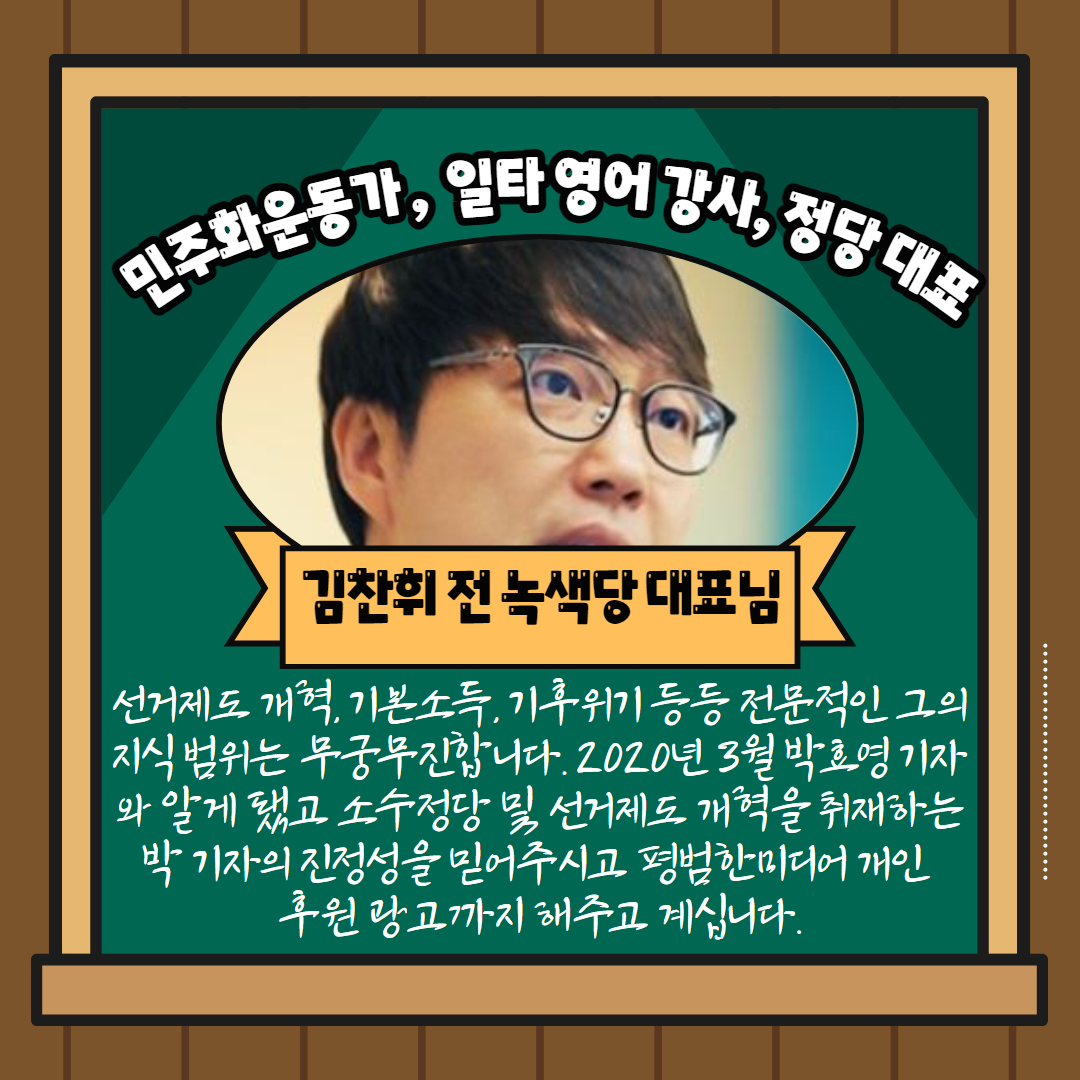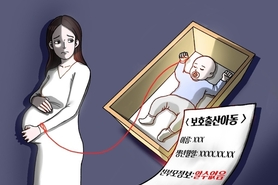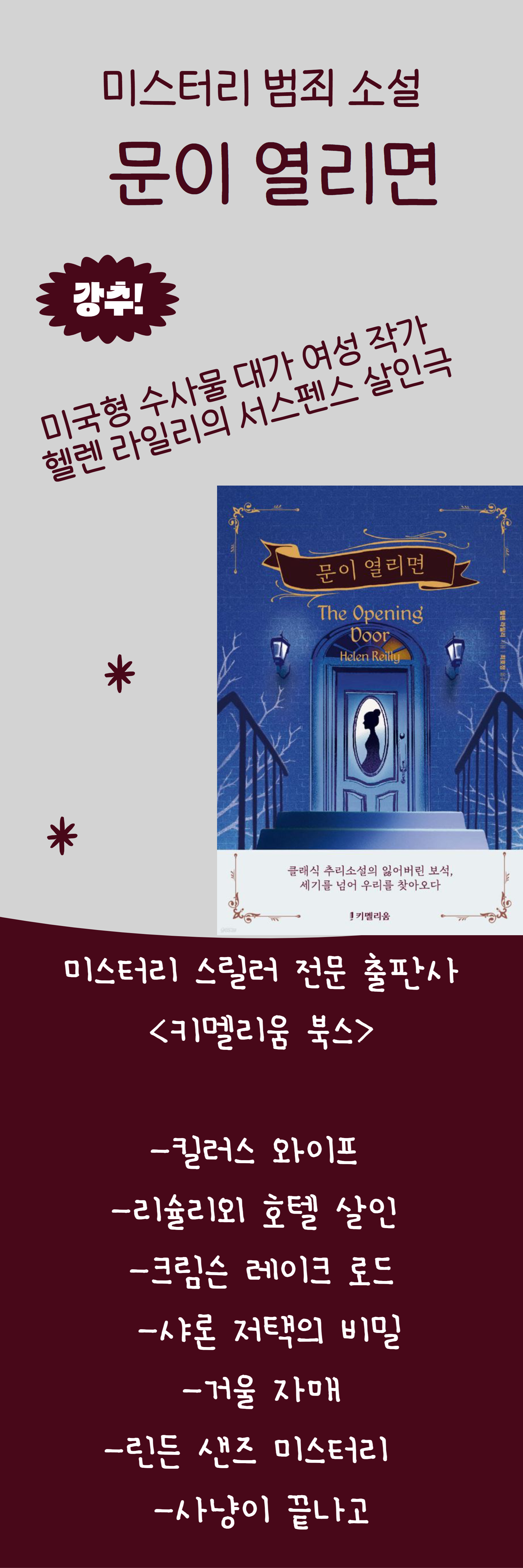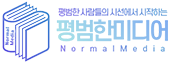※ [노멀 피플의 ‘색깔 있는 시선’] 7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노멀 피플] 힙함에 대한 무의식적 거부감이 있는 나는 런던 베이글 뮤지엄에 가본 적이 없다. 마음 속의 반골 기질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만족감을 느끼는 편이라, 힙한 곳을 잘 즐기지 못한다.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 뭐란 말인가. 베이글을 전시한단 뜻인가? 공간을 브랜딩하니 돈이 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는 말을 듣고 그곳에 대한 호기심이 동하기도 했다. 그러나 힙함에 대한 무의식적 거부감 때문인지 가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저 마켓컬리 물류센터에 가서 집품 공정에서 일하며 그곳의 제품들만 수차례 피킹해봤을 뿐이다. 포장의 외형은 그리 특별할 게 없어보였다.
런베뮤의 창업자 이효정 브랜드 총괄 디렉터(CBO)는 인터뷰에서 브랜드 명칭에 대해 “좋아하 고 또 사랑하는 단어들을 합친 이름”이라고 설명했다.

‘뮤지엄’이라는 단어에 대해선 “시간의 누적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박물관은 단순히 오래된 것을 보관하는 공간이 아니라 문화적 의미를 지닌 유산을 보존하고 전시하는 곳으로 인식된다. 그런데 이효정 디렉터의 인터뷰만 놓고 보면 그에게 뮤지엄은 그런 문화적 의미보다는 그저 오래된 것이 쌓이는 장소에 가까워 보인다. 그렇지만 박물관은 문화유산 자체에 대한 존중 그리고 그 유산을 만들어낸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 전제되지 않으면 성립하기 어렵다. 만일 우리가 경주박물관에 신라 금관을 보러 갔는데 설명판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적혀 있다고 상상해보자.
신라인들은 산처럼 무덤을 쌓는 방식으로 죽음조차도 권력의 과시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누구도 꺼내보지 못할 금관도 부장품으로 넣었다. 귀중한 금을 정교하게 세공해 그것을 무덤에 버린 것은 단지 금만이 아니라 그 금을 세공한 일천한 노동력까지도 낭비한 것이다. 이처럼 금관을 버린 것은 왕의 허영 때문이었다. 신라인들은 미련하게 내세를 믿었고 그곳에서도 왕은 자신이 영원히 권위를 누리기를 바랐기에 금관을 같이 묻도록 한 것이다.
실제로 어떠한 박물관도 이런 방식으로 유산을 설명하지 않는다. 누구도 오래된 시간을 소비하기 위해서만 박물관을 찾지는 않기 때문이다. 박물관은 특정 시대가 남긴 문화유산에 대한 존중 그리고 그 유산을 만든 이들에 대한 존중이 있을 때 비로소 제기능을 할 수 있다.
노동법은 근현대사의 갈등이 남긴 하나의 유산이다. 노동법이 없던 영국 산업혁명기의 산업재해는 일상에 가까웠고 그속에서 대규모 파업이 반복됐다. 프랑스와 영국에서 노동 보호 장치 없이 자본주의가 확산되자 이를 분석하고 비판하려는 시도가 마르크스의 활동과 『자본론』 같은 작업으로 이어졌다. 이후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은 20세기 내내 세계 정치 질서를 흔들었다. 노동법은 이런 굴곡진 근현대사 속에서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갈등을 최소한의 피를 흘리지 않고 조정하기 위해 마련된, 우리 시대의 문화유산이다.
시간의 누적에 대한 인식만 있는 이효정 디렉터의 뮤지엄에 대한 설명에서 문화유산을 존중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는다. 문화적 의미에 대한 감각이 빈약했던 탓일까? 런베뮤에서는 포토존을 위해 빵을 끊임 없이 생산해서 전시했지만 그 빵을 만들어내는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는 시야 바깥으로 밀려난 것처럼 보인다. 굴곡진 근현대사 속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쌓아 올린 노동법 역시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그곳에 남은 것은 그저 멈추지 않고 쌓여 가는 빵의 누적 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