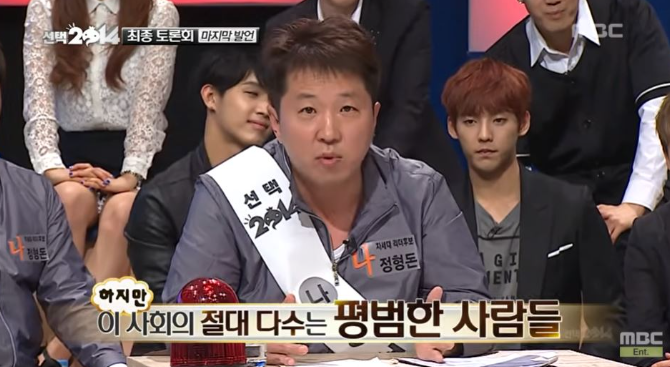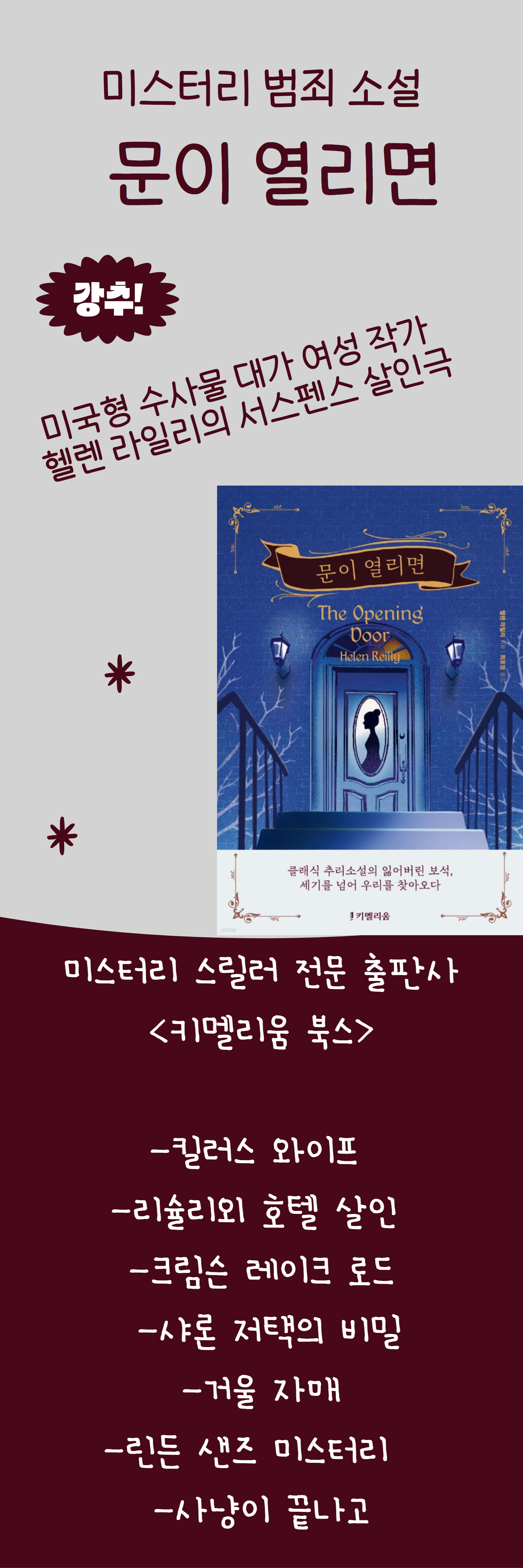※ 2025년 5월16일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된 <세계인권도시 포럼>에서 열린 차인표 배우의 북토크 행사를 기사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뺄 수 있는 대목이 없을 만큼 모든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1~4편에 걸쳐 나눠서 출고하겠습니다. 1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차인표 배우가 맞다. 하지만 이날은 소설 작가로 광주광역시에 왔다. 차인표 배우는 2009년 <잘가요 언덕>이라는 소설을 썼다. 그러나 잘 팔리지 않아서 절판됐다가 어느 순간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차인표 배우는 “지금으로부터 28년 전(1997년) TV 뉴스를 통해서 한 할머니의 영상을 보게 되었다”고 입을 뗐다.
1997년 8월 당시 군대에서 제대하고 드라마에 복귀해서 드라마 촬영 중이었는데 그땐 신혼 때였다. 그날 TV 뉴스에서 생중계되는 한 할머니의 귀국 장면을 보게 되었다. 방송국 카메라들이 공항에 입국장을 찍고 있었고 입국장 문이 열리자 키가 자그마하고 머리가 짧고 눈이 동그란 어떤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 나오셨다.
한국 이름 이남이. 캄보디아 이름으로는 훈 할머니가 50년만에 고국땅을 밟는 순간이었다. 차인표 배우는 훈 할머니를 보고 책을 쓰기로 맘을 먹었다.
아마 그 장면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 훈 할머니는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해서 위안부로 끌려간 수많은 위안부 희생자들 중에 한 분이었다.

차인표 배우는 지난 5월16일 13시반 광주 서구에 위치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5 세계인권도시 포럼>에 참석해서 북토크를 진행했다. 차인표 배우는 먼저 농담으로 입을 풀었는데 장소가 장소이니 만큼 故 김대중 대통령과의 일화를 소개했다.
20여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님을 청와대에서 뵌 적이 있다. 그때 방송의 날이었는데 당시 TV에서 활약하던 배우들과 제작진들이 가서 대통령님과 회의를 한 적이 있다. 회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오찬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대통령께서 날 보고 두 손을 잡으면서 송승헌씨! 잠시 좀 착각을 하셨던 걸로. 어쨌거나 20년 후에 내가 이 자리에 김대중 대통령을 기리는 컨벤션센터에서 세계인권도시 포럼에 참여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한다.
2009년에 출간된 <잘가요 언덕>은 12년만인 2021년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으로 재출간됐다. 차인표 배우는 “인간이 갖고 있는,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갖고 있는 존엄성 그리고 그 존엄성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최고의 가치 공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책을 썼다”고 말했다.
책의 내용이 궁금한 사람들은 읽어보면 될 것이다. 나는 소설 속 여주인공의 이름을 순이라고 지어줬다. 순이는 한국 어린이들에게 국어를 처음 배울 때 교과서에 등장하는 가장 보편적인 이름이다. 내가 여주인공에게 순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이유는 소설 속 여주인공이 겪은 이 문제가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였다는 인식 때문이다.
‘일본군 성노예’라고도 불리지만 가장 널리 알려진 단어는 ‘위안부’다. 2차 대전 전후로 일본 제국주의 정부에 의해 강제로 끌려간 여성들은 국적을 가리지 않고 너무나 많았다.
일본의 역사학자이자 주오대 교수 요시미 요시아키 박사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2차 대전 당시 동아시아 지역에 일본군에 의해 설치된 위안소의 숫자는 약 2천개로 추정이 된다. 강제로 동원된 위안부 여성의 수는 최대 20만명이나 된다. 그중 한국 여성이 52%, 중국 여성 36% 그리고 일본, 대만, 네덜란드, 호주, 동티모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등 많은 나라의 여성들이 포함돼 있다. 한국 여성이 다른 나라 여성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이유는 우리 모두 알다시피 그 당시 한국이 일제 치하에 있었기 때문이다.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를 발굴하고 전시하는 일본 시민단체 WAM이 10여년 걸쳐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과 일본군 공문서 등 다양한 사료를 수집해서 2차 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소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를 발표했다.
훈 할머니는 16세 때 끌려갔다. 1942년 4~5월경이었다. 갑자기 집에 들이닥친 일본군이 짐을 싸라고 강요했고 어느 순간 부산항에서 배에 탔다. 대만에 잠시 정박한 뒤 2주만에 싱가폴로 다다랐는데 훈 할머니와 함께 8명의 소녀들이 있었다. 일본은 이미 싱가폴을 점령한 상황이었는데, 훈 할머니는 싱가폴 내 일본군 기지로 끌려갔다. 그곳에서 ‘하나코’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다고 한다. 일본이 패전한 뒤 훈 할머니는 캄보디아 남자와 결혼했는데 위안부 출신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길 수밖에 없었다. 훈 할머니의 사연은 1997년 6월 캄보디아 언론(프놈펜 포스트)에 의해 알려졌고 그렇게 1997년 8월 고국땅을 밟게 됐다. 훈 할머니는 경북 경산의 조카 집에 머무르다 1998년 9월 캄보디아로 돌아갔고 3년 뒤인 2001년 77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다.
훈 할머니는 싱가폴에서 베트남으로, 베트남에서 캄보디아로 끌려다니면서 계속 위안소에서 희생되었다. 1945년 전쟁이 끝나자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각지로 끌려갔던 여성들의 운명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뉘어졌다. 일부는 패전하고 도주하는 일본군에 의해서 살해되고 매장되었다. 일부는 연합군에 의해서 발견돼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리고 아주 많은 숫자는 한없이 유린당한 것에 대한 수치심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오기를 포기하고 현지에 머무르는 선택을 했다. 훈 할머니가 세 번째 경우였다.

훈 할머니가 한국에 돌아올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다. 1997년 캄보디아를 방문한 모 한국인 사업가와 만났는데, 훈 할머니는 그에게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을 고백했다고 한다.
훈 할머니가 55년만에 고국에 돌아왔지만 모국어를 거의 잊어버리셨다. 하지만 아리랑만큼은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훈 할머니의 모습에서 역설적이게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로 태어난 존귀한 생명, 갓난 아기 훈의 어린 시절이 떠올려보게 됐다. 그리고 곧이어 한 마디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차인표 배우가 느꼈던 것은 “이러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위안부로 끌려가서 희생당한 수많은 소녀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분들을 지켜내지 못한 나같은 한국 남성들에 대한 부끄러움이 모두 혼재된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다. 당시 훈 할머니처럼 위안부로 끌려간 여성들이 어떤 대접을 받았었는지 그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영상이 몇 년 전에 발견이 되었다. 1944년 미중 연합군이 중국 윈난성의 일본군 기지를 점령한 직후 미군 병장 에드워드 페이가 촬영한 영상이다.
차인표 배우는 해당 영상을 재생하기 전에 어머니와 함께 방문한 초등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1분짜리 영상이니까 플레이되는 동안 우리 어머니께서 잠깐 데리고 나가든지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절차를 취해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이제 우리 친구가 들어와도 되겠다. 고맙다. 이러한 소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위안부로 끌려가서 희생된 13세부터 19세, 20세 여성들. 수많은 여성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 머릿 속에 만약에로 시작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떠올랐다. 만약에 이런 소녀들이 끌려가지 않고 고향에서 살 수 있었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엄마가 됐겠지. 아이도 낳았겠지. 몇명이나 낳았을까? 더 나이 들면 할머니도 됐겠지. 그리고 만약에 당시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끝까지 싸웠던 용감한 남자들이 많이 있었다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또 만약에 인간의 보편적인 선과 악을 판단하고 그것을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일본군 장교나 병사들이 많이 있었다면? 그래서 여인들을 성노예로 착취하는 것에 반기를 들고 용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면 역사가 달라졌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었다. 지나간 역사에 만약에라는 상황으로 이야기를 지어내서라도 답을 찾고 싶었던 것 같다. 하지만 모두 덧없는 질문들이었다.
→2편에서 계속됩니다.